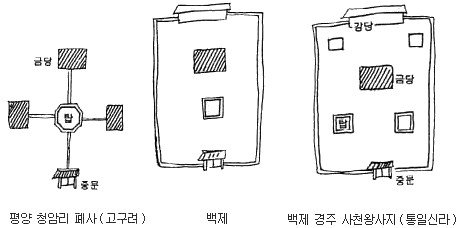[중생의 세계와 부처님 세계]

마음안에 부처를 찾을 길 막막하여 산사로 찾아가는 길에는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를 구분시키는 일정한 구획이 있다. 먼저 사바중생의 속진을 씻어내고 내란 듯한 시냇물을 건너야 한다. 이 중생의 세계를 차안(此岸)이라면 열반부처의 세계를 피안(彼岸)이라 하기에 시냇물을 건너는 다리를 피안교라 부른다. 피안교를 건너 숲길을 지나다보면 부도전과 비림을 만나게 된다. 부처되고자 보살의 길을 걸었던 조사 스님들의 탑묘이다. 그리고 일심으로 들어가는 일주문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를 지켜주는 수호신의 천왕문, 다신 두마음 없을 것을 다짐하는 불이문을 지나면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절에 따라서는 일주문 안에 부도전이 있는 경우(내소사)도 있으며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에 금강문(인왕문)이 있거나 일주문과 천왕문사이에 금강문이 있는 경우(지리산 쌍계사)도 있다.
사찰의 정중앙은 금당이며 그 자락 둘레에 여러 법당들과 작은 법당들 그리고 불탑이 자리하고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가 있다. 산사를 뒤로하고 산을 오르면 산 그자체가 부처님인 듯 곳곳에 마애불상이 중생을 굽어살피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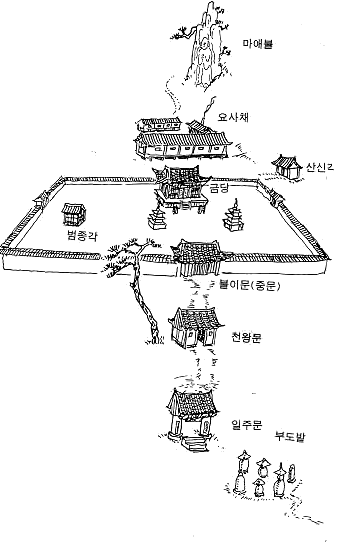
.
[가람 배치]
삼국시대 이후의 우리 나라 역사를 연구할 때 가람 배치는 중요한 시간적인 지표가 된고 있다. 그것은 각 시대마다 가람배치 형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의 시기를 가람 배치 형석에 견주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가람배치의 큰 변화는 금당과 탑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불교 초기에도 그랬지만 삼국시대 초기에는 주 경배 대상이 탑(목탑)이었으나 차츰 탑에서 금당으로 중심 축이 바뀌면서 조선시대에 오면 탑은 단순히 장식적인 구조물로 되어 버린다.
탑과 금당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자리 잡느냐에 따라 일탑일금당식(해인사, 법주사), 일탑삼금당식(봉정사 극락전), 쌍탑일금당식(불국사), 무탑식(송광사), 자유식(통도사) 등으로 분류된다.
각 시대의 가람 배치 모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